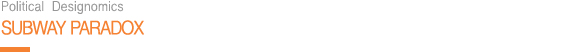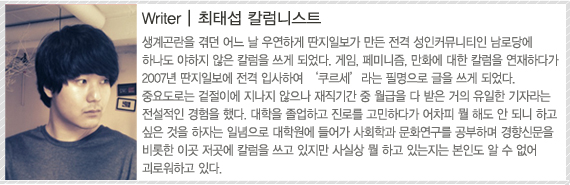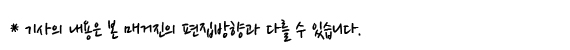SUBWAY PARADOX
2010-12-21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나는 도시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곤 한다. 57분마다 확인하는 어려운 도로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시간에 갈 곳을 갈 수 있다니, 차도남(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차 없는 도시남자)인 나로서는 훌륭한 일이다. 물론 종종 시간대를 잘못 만나면 내가 알던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이라는, 그러니까 지하 3000m암반수 층에서 올라와 사람같이 보이는 뭔가를 삼키고 토해내는 괴물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괴물이 출몰하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과는 상관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나로서는 가끔씩 찾아오는 추억의 팝송어택만 견뎌내면 되는 것이다.
글│최태섭 칼럼니스트( curse13@nate.com)
에디터 | 이은정(ejlee@jungle.co.kr)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나의 미감을 괴롭히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작은 화장실 문화 어쩌구들에서 화장실에 붙여놓은 작은 글귀들이다. ‘어릴 때 책상에 금 그어놓고 짝꿍이 넘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갔다가 맞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버전(그러니까 아직도 잠자려고 누우면 그때 그 일 때문에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일까?)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만약에 남대천의 물이 오염된다면/우리 후손들은 연어잡이 축제도 못하고/선조들의 무지를 원망하고 있으리라...’ 같은 계몽적인 시(詩)도 있다. 세상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좋은 것들 중에 분명히 문학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만 같은데, 지하철에 모아놓은 글귀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모은 것인지가 궁금해질 만큼 가히 ‘문학적 반달리즘’을 구현하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마도 요즘 들어 최고로 거슬리는 것을 꼽자면 ‘지하철광고’일 것이다. 물론 지하철에는 항상 광고가 있어왔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지하철에 있는 지하철 광고’다. 그러니까 지하철의 곳곳에 나붙어 있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의 기업홍보 말이다. 딱히 경쟁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거늘, 서울의 땅 밑을 독점적으로 주름잡고 계신 우리의 지하철은 어째 자신을 알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내가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그 광고의 목적과 효과인데, 광고를 시작한 이후 지하철을 두 번 타던 사람이 세 번을 타고 있다거나, 버스나 택시를 타던 나쁜 시민고객이 개과천선하여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사기업도 아니고, 딱히 물건(예를 들어 지하철 피규어 라던가?) 같은 걸 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알기로 광고란 뭘 알려야 하거나, 뭘 팔아야 하거나,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일 텐데, 딱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면 설마 3번인 걸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 광고들의 수준이 미디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라는 점에서 아쉽지만 실패다. 지하철과 관련된 사연을 공모했다고 해놓고 지하철이랑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연들만 늘어놓는가 하면, 설치된 TV에서 틀어대는 홍보프로그램들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온갖 호들갑과 자화자찬 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는 ‘시민고객’들은 괜하게 ‘미감테러’를 당해야 할 뿐이다. 안 그래도 넘쳐나는 광고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함량미달의 광고를 굳이 이렇게 노출시켜야 하는 이유는 뭐란 말인가?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사람의 사연은 무슨 상관이며, 장애를 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사연은 또 무슨 상관이며, 게다가 이런 얼토당토않은 방식으로 자기 사연을 노출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죄란 말인가?
아마도 이렇게 급작스레 홍보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민영화’의 탓일 터다. 자사광고가 급증한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1234와 5768로 쪼개져 공기업화 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도 기..기업이니까 호..홍보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같은 느낌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 괴로운 ‘형식’과 ‘내용’들은? 답은 ‘최신유행’에 있다. 바로 ‘소통’말이다.
홍보나 디자인에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유입 된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하도 사방팔방에서 소통을 외치다 보니, 오늘날 이것은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컨셉이 되었다. 소통도 상대방이 얘기할 마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거늘, 관료제의 블랙박스 안에서 이런 쌍방향성을 제거당한 소통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를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스피커’로 변모한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따지고 보면 할 마음도 없을 지하철과의 소통은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저 죄 없는 손발만 오글거릴 뿐이다.
안 그래도 역세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더 이상 지하철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고마움은 마음속에 간직할테니 걱정일랑 접어두시고 안전운행에 힘써주시길 바란다.